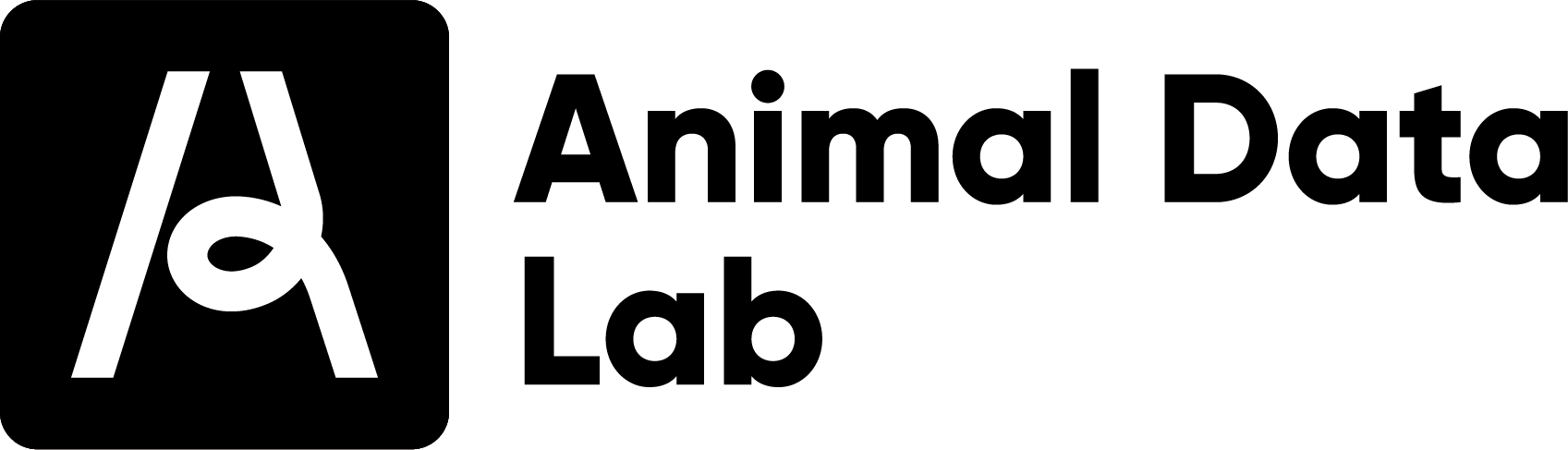할머니
by Youngjun Na
“내 걱정은 하덜 말거라. 니가 늦게까지 고생해서 우째 한다냐잉” 이것이 할머니와 내가 한 마지막 통화가 되어버렸다.
평생 배려만 하며 살아온 내 할머니는 그렇게 한달만 아프시더니 우리 곁을 영영 떠나버렸다.
엄마는 울며 계속 엄마를 찾았고 할아버지는 울며 아내를 찾았다.
숙모는 눈을 감고 염주를 만지작 거렸고 엄마는 계속 울며 내 손만 만지작 거렸다.
삼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나와 내 아내는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었다.
할머니의 마당엔 항상 가득 꽃이 가득 심겨져 있었다. 그리고 결국 그렇게 좋아하시던 꽃속에 파묻혀 연기가 되어 가버리셨다.
Subscribe via RSS